
김혜수는 스타였다. 16살에 데뷔해 늘 스타였다. 섹시하다란 말이 음습하다며 금기였을 때, 섹시하다를 건강하게 우리말에 정착시킨 스타였다. 그래서일까, 배우란 말보다는 스타라는 말이 늘 더 앞에 붙었다.
김혜수 스스로도 배우란 말이 적잖이 무거웠던 것 같다. 그녀는 연기할 때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었다고 했다. 피폐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배우가 될까 싶어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고 토로했다.
김혜수는 여전히 배우란 말이 무거운 것 같지만 그녀는 배우다. 삶으로, 연기로, 좋은 배우를 보여주고 있다. 11월 12일 개봉하는 영화 '내가 죽던 날'(감독 박지완)은 그런 배우 김혜수를 오롯이 보여준다.
'내가 죽던 날'은 중요 사건의 증인인 소녀가 절벽에서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사라진 뒤 그 사건을 자살로 종결짓기 위해 조사하던 형사가 사실을 파헤쳐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김혜수는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게 자신의 탓 인양 자책하던 형사 현수 역할을 연기했다.
캐릭터성이 강한 역할을 주로 맡았던 김혜수는 '내가 죽던 날'에선 캐릭터를 지우고 현수가 됐다. 그건 김혜수가 자신을 배역에 솔직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김혜수와 나눈 긴 이야기를 옮긴다.
-'내가 죽던 날'은 왜 했나.
▶'국가부도의 날' 촬영을 마치고 시나리오를 봤다. 원래 작품을 할 때는 일절 다른 시나리오는 안 본다. 모든 촬영이 끝나면 하루 자고 그 다음 날부터 보기 시작한다. 마침 '내가 죽던 날'은 제안받았던 시나리오들 중 맨 위에 있었다. 제목을 보자마자 확 줌인이 된 것 같았다. 뭐지, 이거 내가 해야 하나 싶었다. 시나리오를 한장 한장 읽으면서 현수랑 나랑 상황은 다른데 내 이야기 같았다. 해야 되겠다란 마음이 들었다. 연기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해야겠다는 마음부터 들었다.
-'내가 죽던 날'은 신인 감독에 여성 캐릭터들이 주요 배역이고 감정이 어둡기에 투자가 쉽지 않았다. 다른 제안들도 많았는데 투자가 돼 제작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기다려줬다던데. 투자가 한창 난항일 때 박지완 감독을 직접 만나 응원도 했다고 하고.
▶신인감독과 작업을 같이 할 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아무래도 현장을 잘 모르고, 현장은 변수가 워낙 많으니깐. 솔직히 신인감독과 작업을 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신인감독과 작업을 할 때는 그 감독의 단편영화랑 했던 작업들을 다 찾아본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지완 감독이 한 다른 것들을 일절 찾아보지 않았다. 이끌리듯이 하게 됐다. 작품을 선택할 때 보통 내 마음이 가냐, 안가냐로 결정하는데, '내가 죽던 날'은 참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다. 완성된 영화가 같이 참여한 우리들 마음이 많이 담긴 것 같아서 좋았다.
사실 이런 영화는 투자되기가 쉽지 않다. 등장인물이 여성이 많고, 감정이 어둡다. 스펙터클한 마블 영화에 관객들이 열광하는데 그런 스펙터클도 없다. 그래도 이런 영화가 하나 정도 있어야 하지 않나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드시 제대로 해내자가 유일한 목표이자 최종목표였다.
-실제 자신의 경험을 영화 속에 녹였다던데.
▶작품을 하면서 사적인 경험을 굳이 이야기를 잘 안 한다.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내가 죽던 날'은 모든 인물이 상처와 절망, 고통의 절정에서 시작한다. 연기를 잘하자라기보다 진짜로 하자고 마음을 먹었으니 그 인물을 표현하려면 내 진짜를 카메라에 담아야 했다.
박지완 감독과 그리고 프로듀서가 두 명이었는데 남자, 여자였다. 살아있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 그 분들과 내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인지 김혜수는 그동안 캐릭터성이 짙은 배역과 그런 연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오롯이 현수로 보이던데.
▶오랫동안 극 중 인물보다 김혜수가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연기할 때 무의식 중에 내 모습을 배제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다 버렸다. 내 감정과 상처를 숨기고 어떻게 이 인물을 진짜로 연기할 수 있을까 싶었다.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감독님이 그걸 영화에 맞다고 생각하면 잘 받아 들여 줬다. 예컨대 원래 시나리오는 처음 등장할 때 현수가 친구인 민정(김선영)과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었다. 그래도 일을 해야하니 경찰정복을 세탁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런데 촬영을 하다 보니 글로는 그게 감정이 잘 느껴지는데 영상으로는 대사만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실제 날 것 같은 감정들. 그래서 감독님에 일단 찍고 나중에 편집할 때 필요하면 넣자고 했던 장면들이, 영화 초반에 그대로 쓰였다. 울다가 자다가 하는 얼굴들.
현수의 감정을 은유가 아닌 직유로 표현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 현수의 오피스텔에서 민정과 대화하는 장면은 실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썼다. 원래는 현수가 잠을 잘 못 잔다는 설정인데 내 경험을 감독님과 이야기했고 그게 좋다고 해서 써봤다. 잠을 못 자고, 그래도 살아야 하니 잠을 자려고 수면제를 먹고, 깨어나도 약기운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잠을 자면 계속 악몽을 꾼다. 내가 죽어있는 모습을 내가 본다. 그런 악몽을 1년 정도 꿨다. 실제 꿈은 어느 도로 밖에서 내가 죽었다. 죽은 나를 내가 보는데, 아무도 모르나 치우지도 안내, 좀 치워주지 그런 생각을 꿈에서 했다. 그런 꿈을 꾸다가 깨고, 다시 자면 꾸고. 아마 그때 내가 심리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것 같다.
그 장면을 찍는 데 민정 역을 맡은 김선영이 너무 좋았다. 연기와 진실 사이 경계에 있는 느낌이랄까. 진짜 친구였다.
-인간 김혜수는 그럼 그 악몽을 어떻게 극복했나. '내가 죽던 날' 현수처럼 일로 잊으려 했나.
▶현수랑 반대였다. 언론에 개인사가 알려진 건 작년이었지만 내가 그 사실을 안 건 2012년이었다. 그때가 '도둑들' 홍보할 즈음이었다. 진짜 처음 알았다. 일을 할 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죽던 날' 현수 대사 중에 "난 진짜 몰랐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 정말 실제로 내가 한 말이었다. 언니가 당시 "진짜 몰랐냐"고 했고, "진짜 몰랐다"고 답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 대사를 할 때 내 얼굴을 잘 보면 소름이 돋아있다.
당시는 진짜로 일을 하고 싶은 않았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 문제가 내가 이 일을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았고. '한공주'에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란 대사가 있다. 그리고 '내가 죽던 날'에 "모르는 게 죄죠"란 대사가 있다. 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던 상태였다.
나는 일을 안 할 거고, 할 수 없다는 게 솔직한 내 상태였다. 그때 '내가 죽던 날'에서 현수 곁에 민정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소속사 대표가 내 곁에 있었다. 3년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희 믿고 가시면 안될까요? 라고 하더라. 배우로 한 시간을 이렇게 마감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상태로 한 게 '직장의 신'이고 '관상'이었다.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미쳐 있어야 하니깐 잊을 수 있더라. 괜히 연예인 돼서 가정파탄이 됐구나란 생각도 들었다. 결과적으론 저도 현수처럼 친구가 있었고, 무언의 도움이 있었고, 일이 돌파구가 됐다.

-그렇게 자신을 담아낸 게 결과적으로 현수랑 인물을 만들어냈는데.
▶어릴 때는 또래에 비해 많이 미숙했다. 어릴 적부터 일을 하다 보니 또래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너무 부족했다. 그게 콤플렉스였다. 그러면서도 어른을 동경해서 그런 척 했다. 너무 미숙했다.
배우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내 숙제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도 물론 있지만 캐릭터를 무기로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을까가 그 인물을 잘 표현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죽던 날'은 나를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캐릭터여서 그랬던 것 같다.
-김혜수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타짜'를 많이 꼽곤 하지만, 과연 대표작일까 싶다. '타짜'는 최동훈 감독의 '타짜'지, 김혜수의 '타짜'일까 싶기도 하고. 그건 김혜수가 돋보였던 작품들은 주로 캐릭터성이 짙어서 그렇기도 했고. 그런 점에서 '내가 죽던 날'은 김혜수의 대표작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그간 했던 작품들 중 내 대표작이라고 생각하는 건 한 편도 없다. 대표작이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최동훈 감독의 '타짜'고, 최동훈 감독의 김혜수였을 뿐이다. 그런 점에선 '내가 죽던 날'은 박지완 감독의 김혜수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내가 죽던 날'이 대표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표작이란 게 있어도 없어도 별 상관은 없다. 다만 없어 왔기 때문에 대표작이란 게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란 생각은 해본 적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힘든 동료들, 힘들었다가 잘 이겨낸 동료들에게 연락처를 일부러 알아서라도 연락 한다고 하던데.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냥 이 모든 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 난 늘 모순이 많고, 언행일치를 하는 사람도 못 된다. 좋은 모습이 언론에 많이 비춰서 그런지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아는 사람도 많다.
그냥 마음 움직이는 대로 산다. 이왕이면 좋은 사람이고 싶고. 또 모르면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데 모른 척 지나가긴 싫다.
난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늘 제가 혼자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죽던 날'에 내 대사는 아니지만 "이제 아무도 안 남았다" "니가 남았다" "니가 너를 구해야지"란 대사가 있다.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펑펑 울었다.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지나가면 단 하나도 무의미한 게 없더라.
-SNS에서 최근 소탈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건 이제는 예뻐 보여야 한다든가, 멋있어 보여야 한다든가, 그런 마음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인가.
▶SNS는 너무 재밌다. 그냥 그 자체가 재밌다. 드라마 홍보 때문에 만든 계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냥 재밌다.
-'내가 죽던 날'에 순천댁으로 출연한 이정은과 첫 연기호흡인데. 이정은이 나이는 같지만 학번은 하나 빠른데. 어땠나.
▶친구가 됐다. 이정은은 솔직히 나보다 어른 같다. 연기 잘하면 나보다 다 어른 같다. 이정은은 내게는 신기루 같은 분이다. 연기를 잘하는, 그런 데에 동경이 있다. (그런 이정은을)만났고, 친구가 됐다. 이 영화로 이정은 같은 사람을 알게 됐고, 얻은 게 너무 감사하다.
김선영을 만난 것도 너무 좋았다. 어릴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될 때, 내가 하루하루 시간을 잘 보내고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배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내 인생이 잘 다져지면 막연하게 좋은 배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꼭 인격과 연기가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일을 하다 보니 알게 되더라.
하지만 이정은과 김선영은 진짜다. 인격과 연기가 정비례하는 배우다. 연기와 인격이 정비례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이번 영화로 두 명이나 만났다. 예상도 못한 선물을 얻은 것 같다.
-후배들의 롤모델로 꼽히곤 하는데. 특히 여배우들의.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느끼나.
▶다행인 건 누가 의미를 부여해도 부담을 안 느끼는 성격이다. 그냥 철없다.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멀리서 보니깐 누군가에겐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것 같다. 책임감이나 부담 때문에 더 잘해야지, 이런 건 전혀 없다.
진짜 저는 나약해요. 일을 하다 보면 강인할 때도 있고, 역할이 강인하다 보니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진짜 저는 나약해요.
-'내가 죽던 날'이 운명 같다고 했는데. 촬영장에서 얻었던 행복 같은 게 완성된 영화에서도 느껴지던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죽던 날'은 나랑 다르지만 그냥 내 이야기 같았다. 몇몇 대사들은 실제로 내가 했던 말이고. 난 감독 이름이 박지완이라고 해서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다. 어떻게 내가 한 말들을 이렇게 대사로 썼지, 남자가, 그랬다.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안 해도 박지완 감독을 만나고 싶었다.
촬영장에선 솔직히 힘들었다. 난 작품을 하면 촬영 할 때가 다가오면 늘 자책한다. 내가 미쳤지, 왜 한다고 했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늘 그런다.
이번 현장에서도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 시나리오는 너무 좋았는데 그게 영상으로 잘 전달될까, 겁이 덜컥덜컥 났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무서웠다. 시나리오만 보고 한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정말 별로 없는데 '내가 죽던 날'은 그랬다. 그러니 우리끼리만 진심이고 진정성 있고, 관객들에게는 그게 안 전달되면 어쩌지, 그런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영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닌 게 배우들을 만날 때마다 힘을 얻었다. 이정은, 김선영, 현장에선 붙는 장면이 별로 없었던 노정의. 힘을 얻었다. 그래서 할 수 있어, 할 수도 있을꺼야, 이랬다.
기자시사회에서 완성본을 처음 봤다. 눈이 안 좋아서 렌즈를 끼는데, 하필이면 도수가 없는 렌즈를 갖고 왔더라. 뿌옇게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의 진심이 영화로 전달된 것 같아서 다행이더라.
-촬영장에서 즐거웠던 적이 없나.
▶배우로서 배우 하길 잘했다는 순간이 한 번도 없다. 촬영장에서 즐거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촬영장이 힘들다, 그런 게 아니다. 배우란 직업이 경이로운 일이긴 한데 일 할 때마다 피폐해지는 것 같은 순간이 분명히 있다.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다. 저는 제가 좋다. 저는 그냥 제가 괜찮아요. 그런데 연기를 할 때는 제가 싫어요. 연기를 하면 꼭 내 못난 점과 한계에 직면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은퇴하자고 생각하곤 했다. 그래, 가진 것에 비해 솔직히 많이 했다고 생각하곤 했다.
3년 전 TV에서 '밀양'을 우연히 다시 봤다.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위대하더라. 그래, 연기는 저런 분들이 해야지. 이제 그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 추위를 많이 타는데 마침 새벽이라 밤바람이 부는데 후련하더라. 그래, 수고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 난 늘 20% 부족했는데 여기까지 하느라 수고했다는 마음이 들더라.
배우란 게 은퇴해요, 라고 안 해도, 제안을 계속 거절하면 자연스럽게 그만 두는 게 아닌가. 그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 소속사 대표가 '국가부도의 날' 시나리오를 가져 주더라. 읽는데 피가 끓어오르더라. 그리고 '내가 죽던 날'을 만났다. 그렇게 관성으로 일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죽던 날'도 여성 감독이고, 최근 여성 감독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2년 전 쯤인가, 내가 제안 받은 시나리오 중 60% 정도가 여성 신인 감독 작품들이었다. 그 중에선 '내가 죽던 날' 때문에 안 했지만 마음을 움직였던 시나리오도 두 개 있었고.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변화가 있는 것인가란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남성 감독이 남성 캐릭터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여성 감독이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좀 더 잘 할 수 있을 테니깐.
다만 남녀를 불문하고 똑똑한 영화 감독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영화감독이란 게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각오 이상의 것을 준비해도 현장에선 많은 변수들이 있다. 영화감독은 그걸 책임지고 지휘해야 하는 선장이다. 잘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가혹할 수 있지만 영화감독이란 자신이 제대로 못 하면 다른 사람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그 압박감과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자리다. 남녀를 불문하고 그런 똑똑한 감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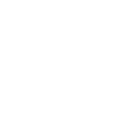 ニュース
ニュース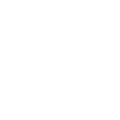 コラム
コラム グッズ
グッズ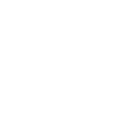 来日情報
来日情報 お問合せ
お問合せ